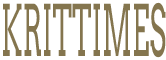02-02
'관람료의 3%' 영화발전기금 부활 수순
 2025-02-07
IDOPRESS
2025-02-07
IDOPRESS
올해 1월부터 폐지됐지만
영화단체 반대하고 세수부족
극장 티켓값도 내리지 않아
국회,재징수 법안 통과시켜
영화인 "독립영화에 필요"찬성
관객 "티켓값 인상 원인" 불만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소에서 사람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한 달 만에 부활 수순을 밟고 있어 영화계 안팎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티켓값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예컨대 관객이 영화관 티켓을 1만7000원에 사면 이 가운데 510원이 영화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실제 납부 주체는 영화관이지만 법적인 납부 대상은 관객이기 때문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오래도록 찬반 논란에 올라 있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부는 관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부과금이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조세 성격의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다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부과금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취지는 국민의 티켓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었지만,부과금 폐지가 독립·예술영화 산업 기반을 흔들고 결국엔 극장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과금이 폐지된 후에도 영화관이 티켓값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한 영비법 시행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영화관 측에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티켓값 인하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면서도 "하지만 티켓 가격 결정권은 영화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되살리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현장은 혼란스럽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부과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개 영화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반발해왔던 영화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사실상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부과금은 약 262억원이지만,이조차도 올해 정부의 영화산업 진흥사업 예산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영화관 관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다르다. 3% 이하라도 티켓값을 내릴 수 있도록 민관 합의를 이끄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국회가 법안을 원점으로 돌려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티켓값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한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영화 티켓값에 영화발전기금 같은 게 포함돼 있는 줄도 몰랐다" "2만원 가까이 되는 영화관 티켓값은 과도하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영화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최근 콘텐츠 소비문화 변화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해마다 줄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영화관 관계자는 "수년간 전반적인 비용 상승에도 관객 발길이 더 끊길까 티켓값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영화사업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도 부담금(부과금)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정부 예산 효율화를 강조해왔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까지 맞물린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않은 정부 예산에서 부담금까지 사라지면 세수 기반이 흔들려 장기적으로 여러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뿐만 아니라 폐지가 결정된 다른 부담금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송경은 기자]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